
2007년 <한겨레> 대선보도자문단에서 활동할 당시의 김기원 교수.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2013~14년 ‘베를린통신’ 등
블로그·페이스북에 쓴 글 묶어
진보파에 ‘실사구시’ 고언
블로그·페이스북에 쓴 글 묶어
진보파에 ‘실사구시’ 고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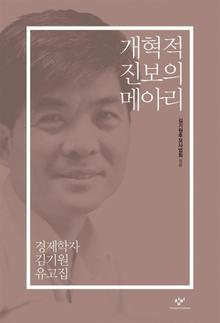
개혁적 진보의 메아리
-경제학자 김기원 유고집
김기원추모사업회 엮음/창비·1만8000원
-경제학자 김기원 유고집
김기원추모사업회 엮음/창비·1만8000원
<동물농장> <1984>의 작가로 널리 알려진 ‘사회주의자’ 조지 오웰은 ‘악마의 대변인’(Devil’s advocate·선의의 비판자)을 자처하며 어느 책에 이런 구절을 남겼다.
“지금 방식으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사회주의에는 근본적으로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은 정작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할 사람들을 쫓아버리는 무엇이다. (…)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홍보에 가장 해를 끼치는 것은 바로 그 신봉자들인 것이다.”
여기서 ‘사회주의’를 한국의 ‘진보파’ 혹은 ‘진보파의 주장’으로 바꾸면, 아마도 가장 흡사한 입장을 견지한 사람은 고 김기원 교수(1953~2014)일 것이다. 그의 1주기인 지난 7일에 맞춰 지인과 후학들이 유고집을 엮어 냈다. 김 교수가 연구년인 2013년부터 약 1년간 독일에서 쓴 ‘베를린통신’ 가운데 일부, 2012년에 펴낸 <한국의 진보를 비판한다>에 제외됐던 2011년 이후 글 등 35편이 실렸다. ‘개혁적 진보의 메아리’라는 책 제목은 고인의 블로그 이름(blog.daum.net/kkkwkim)에서 따왔다.
김 교수가 블로그 또는 페이스북이라는, 제약과 부담이 덜한 공간에서 자유롭게 써내려간 글들은 전공인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미 ‘노동귀족’이 돼버린 대기업과 공공부문 노조, 사회적 갈등은 풀지 못하면서 극한 대립만 되풀이하는 정치권, 시대착오적인 북한의 ‘왕조적 독재체제’ 등이 모두 비판대에 올려진다. 그러나 김 교수가 가장 많은 공을 들인 것은 역시 진보파의 문제였다.
그는 이 문제를 정확히 보기 위해 ‘4분면 분석법’을 제안한다. 보통 X축의 왼쪽·오른쪽에 진보와 보수를 놓는 2분법에 더해 김 교수는 Y축을 새로 긋고 위아래에 개혁과 수구를 놓는다. 진보는 개혁적 진보와 수구적 진보로, 보수도 개혁적 보수와 수구적 보수로 나눠서 엄밀하게 보자는 것이다. 여기서 개혁은 상식의 다른 말이고, 수구는 몰상식과 동의어다.
자신의 좌표를 개혁적 진보로 설정한 김 교수는 수구적 진보나 그와 비슷한 관점을 날카롭게 비판한다. 한국의 대다수 진보파는 변화하는 현실에 둔감하고 당위론에 치우쳐 있다. 대개 80년대에 대학을 다닌 그들은 반독재 민주화투쟁 당시의 관성과 행태를 버리지 못했다. 진보파가 근래에 더 부진해진 이유는 한국 사회에 진보와 개혁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인식을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진보파는 선악이 공존하는 인간 본성의 이중성을 잘 모르며, 악한 면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 넘치는 자기 확신으로 대중을 가르치려 들지만, 그들의 마음을 읽어내는 노력은 항상 부족하다. 그럼에도 내부 비판은 보수에게 악용당한다는 이유로 봉쇄하려 든다. “보수수구세력에 악용될 위험이 있더라도 진보개혁세력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면 그냥 있을 수는 없다”는 김 교수의 다짐에는 이런 인식이 깔려 있다.
현실을 보면, 진보파 지식인들은 세월호 참사도 신자유주의 탓이라고 한다. 그러나 300여명이 목숨을 잃은 1970년 남영호 참사는 신자유주의가 생겨나기 전에 일어났으며, 신자유주의 종주국인 미국·영국에선 비슷한 사례가 아예 없다. 그러니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신자유주의 타령 대신 타락한 직업윤리를 따져 보는 게 더 의미 있을 것”이다.
평균 연봉이 1억원이라는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 노조와 그 못지않은 공기업 정규직은 “노동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며 부당한 특권을 유지하려는 수구세력으로 변질해가고 있”다. 정규직 정년퇴직자·장기근속자 자녀를 우선 채용해달라고 공공연히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98년 현대차, 2000년 대우차, 2009년 쌍용차 분규가 유독 처절했던 것은 해고가 곧 특권의 상실을 뜻하기 때문이다. “이런 고용조정을 진보파는 ‘신자유주의’ 운운하면서 비판했지만, 경영상황이 악화되었는데도 고용을 유지하라고 하는 것은 (동구식) 사회주의 기업을” 바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김 교수는 짚고 있다.
또 현대차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요구도 그는 무리라고 봤다. 그렇게 되면 불황이 닥쳤을 때 고용조정이 불가능해 회사의 존립 자체가 어려워진다. ‘희망버스’는 “따뜻한 가슴에서 우러난 이웃 사랑의 표현이지만, 일감 없는 회사에서 투쟁을 통해 일감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고, 특히 현대차 희망버스는 불필요한 폭력 행사로 대중과도 멀어졌다.
그렇다고 김 교수가, 속된 표현으로 ‘지적질’만 한 것은 아니다. 그는 대기업 노동자의 특권 축소와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 확대를 통해 양쪽의 격차를 좁히고, 추가로 필요한 복지비용은 재벌뿐 아니라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한테서 더 걷자고 제안한다. 그래야 노동유연성이 높아져 쌍용차 같은 격렬한 저항이 줄고, 비정규직의 수요 또한 감소하는 선순환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김 교수는 증세의 당위성만 앞세울 게 아니라 ‘증세의 정치학’을 연구해 조세저항에 대비해야 하며, 더 많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소선거구 의원의 수를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를 크게 늘리는 정치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요컨대 그는 진보파가 실사구시를 통해 진영 논리를 벗어던지고 유능해지기를 바랐다. ‘유신’을 흉내내는 정부에 맞서 진보파 또한 독재시대 저항 방식으로 회귀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의 ‘부재’가 더욱 커 보이는 연유다.
강희철 기자 hckang@hani.co.kr
'책, 논문, 칼럼 등 소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책의 향기]진보가 가야할 방향 제시한 故김기원 교수의 유고집 (0) | 2015.12.12 |
|---|---|
| 진보는 개혁 속에서 거듭나야 한다: '개혁적 진보의 메아리' (0) | 2015.12.11 |
| "재벌 개혁이 재벌 타도는 아니잖나" (0) | 2015.12.10 |
| “재벌개혁 지론 묻어둘 수는 없었다” (0) | 2015.12.10 |
| 하늘에서도 아내를 걱정하고 있을 당신에게 (0) | 2015.12.08 |